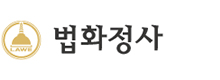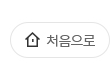불교 이야기
- 불교란
-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가르침
- 부처님의 경전
불교란
불교의 의의
불교(佛敎)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고,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부처가 되는 길을 제시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어인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합니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다른 사람도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침을 주며, 지혜와 복덕이 원만하고, 이치와 사리에 어긋남이 없으며,
5욕(欲)에 집착하는 미혹(迷惑)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를 열고,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를 끊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불자(佛子)라면 누구나 불(佛), 법(法), 승(僧), 3보(寶)에 귀의하고, 사홍서원(四弘誓願)의 원력을 세우며, 6바라밀(波羅密)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를 믿고 수행하여, 최종 목표인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실천력과 지속력, 집중력을 쏟아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특징
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 즉 자각의 종교입니다. 다른 신이나 절대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여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나. 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적, 이론적, 관념적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실천과 행동의 종교입니다.
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지혜란 우주의 진리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라.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종교입니다.
마. 불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라는 미명아래 수없는 전쟁으로 무고한 죽음을 당해왔다. 이는 종교의 본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이 2,600여 년간 평화를 지켜 왔습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점
눈 있어 볼 수 있고 마음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총검이나 대포를 들이대고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강요에 의한 개종은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적도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모순됩니다.
무력으로 약탈한 적은 없고, 붓다의 이름으로 단란한 가정을 피로 물들인 적도 없으며, 한에 사무친 여인네들이 붓다의 이름을 입에 올려 저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붓다! 그분의 가르침은 피의 얼룩으로 더렵혀진 적이 없습니다. 붓다야말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 배품으로 이루어진 평화, 연민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평화를 가르치신 분이며,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원칙에 의한 생활, 우아한 생활을 가르치며, 당연한 귀결로 불교는 관용의 종교입니다.
태양 아래 가장 자비로운 종교체제가 불교입니다. 교법의 전파과정 그 어디에서도 피를 본 적이 없는 종교입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박해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붓다는 사람들에게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고 현 순간을 성화(聖化)시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은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대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래는 다만 길을 일러줄 따름입니다.
깨달으신 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립심을 기르도록 권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깨달음과 고(苦)로부터의 해방은,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갈고 닦음으로써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불교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탄생
기원전 624년(지금부터 2642년 전) 인도 북쪽 지금의 네팔 남쪽의 카필라국 석가족 정반왕(숫도다나왕)과 마야부인사이에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탄생 후 7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마야부인의 동생인 마하프라쟈파티에 의해 양육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의미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며 출가전 이름은 고타마 싯달타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 일성이 곧 부처님 탄생게(誕生偈)인데 이는 곧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 일체개고 아당안지 (一切皆苦 我當安之)”입니다. 이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모든 고통 내가 마땅히 그치게 하리라”는 뜻으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의 선언이고, 나아가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선언하는 생명존중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사타’라는 선인이 나타나 왕에게 이르기를 “이 왕자가 장성하여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면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성왕이 되시고 만약 출가하여 수행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장
어느 해 봄, 태자는 부왕을 따라 춘경제에 참석하였는데 새가 벌레를 쪼아 먹는 약육강식의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염부수(閻浮樹) 나무아래서 깊은 사색에 잠기었습니다.
태자가 성장하던 어느 날, 네 성문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동문에서는 늙은 노인을 보고 남문에서는 병자를 보았으며, 서문에서는 죽은 자를 보고 북문에서는 수도하는 수행자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마침내 태자 나이 17세 때 아쇼다라 공주와 결혼하였고, 29세에 아들 라훌라(장애라는 의미)가 태어나게 됩니다.
출가와 고행
29세에 마부 차타카를 데리고 애마 칸타카를 타고 궁전을 빠져나와 출가의 몸이 됩니다.
출가 후 태자는 처음에 ‘바가바’ 선인을 찾아 고행하는 실제의 모습을 보았고, 다음에는 ‘아라다-칼라마와 우드라카-라마푸드라’를 찾아가 높은 도를 얻고자 수행하는 모습을 차례로 보았으며, 본인 스스로 수행을 실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수행의 길이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마가다국에 가서 나이란쟈나 강가의 우루빌바의 우거진 숲(고행림) 속에서 5명의 비구(안냐코단냐 밧디야, 밧파, 마하나마, 앗사지)와 격심한 고행을 시작하였습니다.
6년간의 처절한 고행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5명의 수행자들은 태자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깨달음
오직 혼자가 된 태자는 목숨을 걸고 최후의 명상에 들었습니다.
‘피는 말라붙고, 살갗은 썩어지고, 뼈는 떨어져 나가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하였고, 악마와의 온갖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행 끝에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아래서 마침내 동녘 하늘에 샛별이 하나 둘 돋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태자의 마음도 밝게 빛났습니다. 이때가 태자 나이 35세 음력 12월 8일(성도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때부터 태자는 부처님, 무상각자, 석가모니, 세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법륜(진리의 수레바퀴-교화, 포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어떻게 중생이 이 심오한 경지를 이해할까’하며 망설일 당시 범천이 부처님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을 권청하여 중생교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 법문은 바로 수행 중 자기 곁을 떠난 5명의 비구를 찾아가 녹야원에서 설법한 초전법륜입니다. 콘단나, 아사지, 마하나마, 밧디야, 바파 즉 이들 5명이 최초의 제자입니다.
부처님 최초의 재가신도는 야사의 아버지(최초 우바새), 야사의 어머니(최초 우바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의 길을 떠나라’며 포교의 중요성을 역설 하셨습니다. 우루벨라로 가는 중에 마가다국에서 가섭 삼형제를 교화 하셨고 왕사성 죽림정사에 들러 빔사라왕을 교화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포교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죽림정사가 바로 불교 최초의 가람(절, 사찰)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세존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사리불, 목련 같은 제자를 비롯하여 2천 여 명의 제자들이 귀의하였고 부처님 아버지인 정반왕, 양모, 부인 아쇼다라까지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반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포교를 계속하던 부처님께서는 80세를 맞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으로 가시는 도중 바이사리에서 병을 얻으시자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곳을 떠나 파바 마을에 이르러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독버섯이 든 음식을 드시고 병세가 악화되셨지만 고통을 참으시면서 ‘쿠시나가라’로 가시던 중 사라쌍수 나무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최후의 유훈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입니다. 즉 해설하면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진리의 등불로 삼고 자기를, 진리를 의지처로 하여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할지언정,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가. 불교 4대 성지
탄생지-룸비니동산, 성도지-붓다가야, 초전법륜지-녹야원, 열반지-쿠니나가라
나. 불교 4대 재일(齋日)
탄생재일-음4월8, 출가재일-음2월8일, 성도재일-음12월8일, 열반재일-음2월15일
부처님의 가르침
삼장
부처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으로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이 있습니다.
* 대장경(大藏經) : 모든 경, 율, 논 삼장을 모은 총칭입니다. 모든 진리가 그 속에 갖추어져 큰 창고와 같다고 하여 대장경이라고 하며, ‘일체경’, ‘삼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중도(中道)
불교의 핵심교설의 하나로, 한쪽에 치우친 양 극단을 떠난 불생불멸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불교의 중도란 ‘쾌락’과 ‘고행’의 상대적인 두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학(三學)
성불할 이가 닦아야 할 세가지 즉 계(戒), 정(定), 혜(慧)입니다. 계는 계율, 정은 선정, 혜는 지혜입니다.
삼독(三毒)
성불할 이가 없애야 할 세가지 독. 탐(貪), 진(瞋), 치(痴)입니다. 즉 사람은 탐내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삼법인(三法印)
부처님의 진신한 세가지 가르침은
.제행무상(諸行無常)-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고 변화합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모든 변화하는 것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열반적정(涅槃寂靜)-모든 괴로움의 불을 끈 적멸의 상태 최상의 경지입니다.
사성제(四聖諦)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고(苦), 집(集), 멸(滅), 도(道)입니다.
.고(苦)는 인간의 현실적 괴로움인 생,노,병,사를 의미합니다.
.집(集)은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입니다.
.멸(滅)은 번뇌와 고통이 모두 없어진 해탈, 열반의 상태입니다.
.도(道)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팔정도(八正道)
멸(滅)에 이르기 위한 8가지 바른 길입니다.
편견없이 바로 보는 정견(正見),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유(正思惟), 바르게 말하는 정어(正語), 바르게 행동하는 정업(正業), 바르게 생활하는 정명(正命), 바르게 노력하는 정정진(正精進), 마음을 바르게 수행하는 정념(正念), 바르게 집중할 수 있는 정정(正定)입니다.
연기법(緣起法)
연기(緣起)란 말의 뜻은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즉 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성립됩니다. 따라서 인연에 의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립되어 있을 뿐이며,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기법은 사물의 존재와 성립에 대한 법칙을 밝힌 가르침입니다. 특히 12가지 요소가 서로 인과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성립되는 것을 12연기라 하며, 이는 초기 불교 이래로 연기법의 기본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2가지 요소는 무명(無明), 행(行), 식(識), 명색(名色), 6입(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 등입니다. 이러한 12연기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파했던 가르침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며, 불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① 무명: 4제(諦) 등의 진리를 모르는 미망의 근본인 무지를 말합니다.
② 행: 무명으로부터 다음의 의식 작용을 일으키는 상(相)으로 우리가 짓는 업을 뜻합니다.
③ 식: 인식 주관으로서의 6식(識)입니다.
④ 명색: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는 마음, 또는 정신을 명(名)이라 하고, 형체가 있는 물질 또는 신체를 색(色)이라 합니다.
⑤ 6입: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 등의 6근(根)입니다.
⑥ 촉: 감각과 지각 등의 성립 조건인 6근, 6경, 6식, 이 셋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⑦ 수: 6근, 6경, 6식, 셋이 만나서 촉을 이루고, 그 후에 생기는 고통, 쾌락 등의 느낌을 말합니다.
⑧ 애: 욕망의 만족을 바라는 욕구와 열망, 갈애 등입니다.
⑨ 취: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집착을 말합니다.
⑩ 유: 생사 윤회하는 중생의 생존계로서 3계(界) 25유(有)를 말합니다.
⑪ 생: 중생이 어떤 부류의 중생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⑫ 노사: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으로서 중생의 모든 고통을 대표합니다.
부처님의 경전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준 이름으로 반야중도해탈의 세계를 말씀하신 경으로,금강경이 반야부 경전의 골수(骨髓)라면,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의 안목(眼目)에 해당되며 8만대장경의8만4천 법문을 260자 안에 요약한 요체(要諦)라 할 수 있습니다. 불문에서는 예불이나 각종 의식에는 물론 초종파적으로 독송되는 경전으로서, 불교에 입문하지 않더라도 불교사상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기에 앞서 암송이 필수적이라 할 만큼 불교입문서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경
금강경의 원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범어로는 Vajira-Prajina-pramita-sutra sutra 로써, 금강(金剛)같이 굳은 지혜(智慧)로써 생사(生死)의 강물을 건너 평화로운 저 언덕에 이르는 법(法)을 말씀한 경(經)이란 뜻으로, 이 경의 주요 사상은 공(空)으로서 모든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서 아공(我空)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금강반야경은 600여권의 대반야경중 577권에 해당되며, 문장이 짧고 간결하며 말세수행자에게 보다 핍진한 교시(敎示)가 있기 때문에 반야대부중에서 유독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천수경
천수경의 본래 명칭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이며 달리 [천수다라니]라고도 합니다.
천수경은 반야심경과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행사 때에 제일 많이 읽혀지는 경으로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위신력, 그리고 중생이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며 중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발원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미타경
아미타경은 '호념경' 이라고도 하며, '무량수경'을 대경이라 함에 대하여 소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사리불을 상대로 아미타불과 그 국토인 극락세계의 공덕장엄을 말씀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에 6방의 많은 부처님네가 석존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시며 특별히 왕생을 권한 경전으로 매우 짧으면서도 아주 쉽게 정토신앙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경전이 제자들의 간청으로 인한 부처님의 설법인 데 반해 이 경은 부처님 자신이 자진해 설하고 있는 이른바 [무문자설경]의 하나로 간결유려한 문장으로서 독송경전의 으뜸입니다.
원각경
원명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입니다.1권 12장. 당(唐)나라 영휘(永徽)연간에 북인도 계빈국(賓國)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하였습니다. 대승(大乘) ·원돈(圓頓)의 교리를 설한 것으로, 주로 관행(觀行)에 대한 설명인데, 문수(文洙) ·보현(普賢) ·미륵보살 등 12보살이 불타와 1문1답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고려의 지눌(知訥)스님이 이 경을 중시하여 요의경(了義經)이라 하여 퍼뜨리기 시작하여, 조선 초에 함허(涵虛)가 《원각경(圓覺經)》 3권을 지으면서 한국 불교 전문강원(專門講院)에서의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마경(維摩經)》 《능엄경(楞嚴經)》과 함께 선(禪)의 3경(經)이며, 이에 대한 주석서(註釋書)로는 당나라 종밀(宗密)의 《원각경소(圓覺經疏)》(6권), 《원각경초(圓覺經褻)》(20권) 《원각경대소(圓覺經大小)》(12권) 등 9종이 있습니다.
금강삼매경
중국에서 위찬(僞撰)된 것이라고 전하나, 신라에서 재편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전입니다. 《송고승전(宋高僧傳)》의 원효(元曉) 전기에는 8품(品), 30지(紙) 가량으로 되었는데, 현존본은 7품 뿐입니다.
7품이라는 것은 정설분(定說分)의 7개품만을 말한 것인 듯합니다. 이 경전은 그 논소(論疏)인 원효의 《금강삼매경론》(3권)에 의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에 대하여 최초의 주석을 쓴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종요(宗要)를 “묶어서 말하면 일미관행(一味觀行)이요, 풀어 말하면 십중법문(十重法門)이 종(宗)이라”고 하였습니다.
법화경-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이 경은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삼승(三乘)을 한데 모아 일승(一乘)의 큰 수레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정신에서 여래는 큰 인연으로 세상에 나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삼승은 단지 방편으로 설해졌을 뿐이고, 이러한 여래는 상주 불멸하여 이미 여래는 오래전에 성불하였으며 단지 방편으로 세상에 나와 성도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며 여래의 수명은 무량하다고 하였습니다.
한역본으로는 3가지가 있으나, 구마라습(鳩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 28품이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원본이 네팔·티베트 등에서 발견되어 편집 정리된 것이 3가지 있으며 그 외 중앙아시아어역·영역·불역 등이 이루어져서 이 법화경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교리와의 비교 등 실로 세계적인 범위에 미치고 있습니다.
화엄경
원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으로 한국 불교전문강원의 교과로 학습해 온 경전이기도 합니다.
산스크리트 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초기의 중요한 경전으로 한역본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권본(418∼420), 실차난타(實叉難陀)역의 80권본(695∼699), 반야(般若)역의 40권본(795∼798)이 있는데, 상기 2본 중 최후의 장인 입법계품(入法界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티베트어역은 80권본과 유사한 완본이 있습니다. 본경은 <60화엄>이 34장, <80화엄>이 39장, 티베트어역이 45장이지만, 실은 처음부터 현재의 형태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각 장이 독립된 경전으로 유통되다가 후에 《화엄경》으로 만들어졌는데, 필경 중앙아시아에서 4세기경 집대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각 장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은 십지품(十地品)으로, 그 연대는 1~2세기경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 원전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십지품과 입법계품입니다.
본경은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이며,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교주로 합니다. 60권본은 7처(處) ·8회(會) ·34품(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적멸도량회(寂滅道場會:제1 ·2품)와 제2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제3∼8품)는 지상, 제3도리천회(忉利天會:제9∼14품), 제4야마천궁회(夜摩天宮會:제15∼18품), 제5도솔천궁회(兜率天宮會:제19∼21품, 제6타화자재천궁회(他化自在天宮會:제22∼32품)는 모두 천상이며, 설법이 진행됨에 따라 회좌의 장소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7은 다시 지상의 보광법당회(제33품), 제8도 지상의 서다림회(逝多林會, 즉 祇園精舍:제34품)입니다.
제1회는 불타가 마가다국(國)의 깨달음을 완성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때 불타는 비로자나불과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보살이 차례로 불타를 찬양하는 노래를 읊습니다. 긴 찬양의 노래가 이어진 다음, 이 아름다운 세계가 불타의 신력(神力)으로 크게 진동하고, 향기롭고 보배로운 구름이 무수한 공양구(供養具)를 비오듯 뿌립니다. 이러한 세계를 연화장 장엄세계해(蓮華藏莊嚴世界海)라고 합니다.
제2회에서 불타는 적멸도량에서 멀지 않은 보광법당의 사자좌(師子座)에 앉아 있습니다. 문수(文殊)보살이 사제(四諦:苦 ·集 ·滅 ·道의 네 진리)를 설하며, 또한 10인의 보살이 각각 10종의 심원한 법을 설합니다.
제3회부터는 설법의 장소를 천상으로 옮기고 여기서는 십주(十住: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생활방식, 즉 初發心住 ·治地住 ·修行住 ·生貴住 ·具足方便住 ·正心住 ·不退轉住 ·童眞住 ·法王子住 ·灌頂住)의 법을 하며, 제4회에서는 십행(十行:보살이 행해야 할 열 가지 행위, 즉 歡喜行 ·饒益行 ·無恙恨行 ·無盡行 ·離癡亂行 ·善現行 ·無著行 ·尊重行 ·善法行 ·眞實行), 제5회에서는 십회향(十廻向:수행의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보살의 열 가지 행위), 제6회에서는 십지(十地)를 설명하고 있는데, 십지는 보살의 수행단계를 10종으로 나누는 것으로 《화엄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즉 제1은 환희지(歡喜地)로서 깨달음의 눈이 뜨여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경지,
제2는 이구지(離垢地)로서 기본적인 도덕으로 직심(直心)을 일으켜 나쁜 죄의 때를 떨쳐버리는 경지,
제3명지(明地)에서는 점차 지혜의 빛이 나타나,
제4염지(燄地)에서 그 지혜가 더욱 증대되고,
제5난승지(難勝地)에서는 어떤 것에도 지배되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며,
제6현전지(現前地)에서는 일체는 허망하여 오직 마음의 활동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며,
제7원행지(遠行地)에서는 열반에도 생사에도 자유로 출입하고,
제8부동지(不動地)에서는 지혜가 다시는 파괴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릅니다.
그리하여 목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9선혜지(善慧地)에서는 불타의 비밀의 법장(法藏)에 들어가 불가사의한 대력(大力)을 획득하고, 10법운지(法雲地)에서는 무수한 여래가 대법(大法)의 비를 뿌려도 이를 다 증득(證得)하며, 스스로 대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의 무명 ·번뇌의 불길을 꺼버립니다.
따라서 십지 전체를 통하여 보살은 자신을 위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한다는 이타행(利他行)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설법이 요약되어 설명되고 있으며, 제8회에는 선재(善財)라는 소년이 차례로 53명을 찾아가서 법을 구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53명 중에는 보살만 아니고, 비구 ·비구니 ·소년 ·소녀 ·의사 ·뱃사공 ·신 ·선인 ·외도(外道) ·바라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도심에서는 계급도 종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화엄경》은 현상세계는 상호 교섭 ·활동하여 무한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사무애(事事無礙)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에 근거합니다. 이 《화엄경》을 전거로 하여 후에 중국에서는 화엄종이 성립되었으며, 그 주석서로는 60권본에 대한 현수(賢首)의 《탐현기(探玄記)》, 80권본에 대한 징관(澄觀)의 《대소초(大疏鈔)》가 가장 유명합니다. 또한 《탐현기》의 선구로서 지엄(智儼)의 《수현기(搜玄記)》 《공목장(孔目章)》 등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화엄경》은 현상세계는 상호 교섭 ·활동하여 무한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사무애(事事無礙)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에 근거합니다. 이 《화엄경》을 전거로 하여 후에 중국에서는 화엄종이 성립되었으며, 그 주석서로는 60권본에 대한 현수(賢首)의 《탐현기(探玄記)》, 80권본에 대한 징관(澄觀)의 《대소초(大疏鈔)》가 가장 유명합니다. 또한 《탐현기》의 선구로서 지엄(智儼)의 《수현기(搜玄記)》 《공목장(孔目章)》 등이 있습니다.
<정리 : 법화사상 연구소>